우연히 어느 SNS에서 본 한 페이지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책. 표지에는 산문이라고 적혀있지만 책 구매처에는 시/에세이로 분류. 더해서 책 설명에는 비평이자 편지라고 적혀있어서 의아했다. 그런데 읽어보면 왜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달고 있는지 자연히 깨닫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문체로 자신의 인생과 그 일부인 공연을 이야기하는 책.
#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시/에세이로 분류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산 책. 그저 누군가가 찍어 올린 페이지와 제목, 그리고 공연에 관한 이야기라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 알고 구매하게 되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던, 오히려 만족스러운 소비.


전체적으로 상아색의 양장본에 띠지와 가름끈은 흰끼 섞인 파스텔 색감의 초록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책의 뒷면은 음각 처리를 한 후, 저자가 실제로 찍은 사진이 붙어있었다.
개인적으로 책을 구매하면 꼭 띠지를 버리지 않고 모으는데, 이렇게 책의 한 구절이 적혀있으면 특히나 소장하고 싶다.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도 포인트 색이 들어가 있다. 저자를 소개하는 부분만 봐도 왜 시/에세이로 분류가 되었는지 감이 온다.
# 목차와 각주, 그리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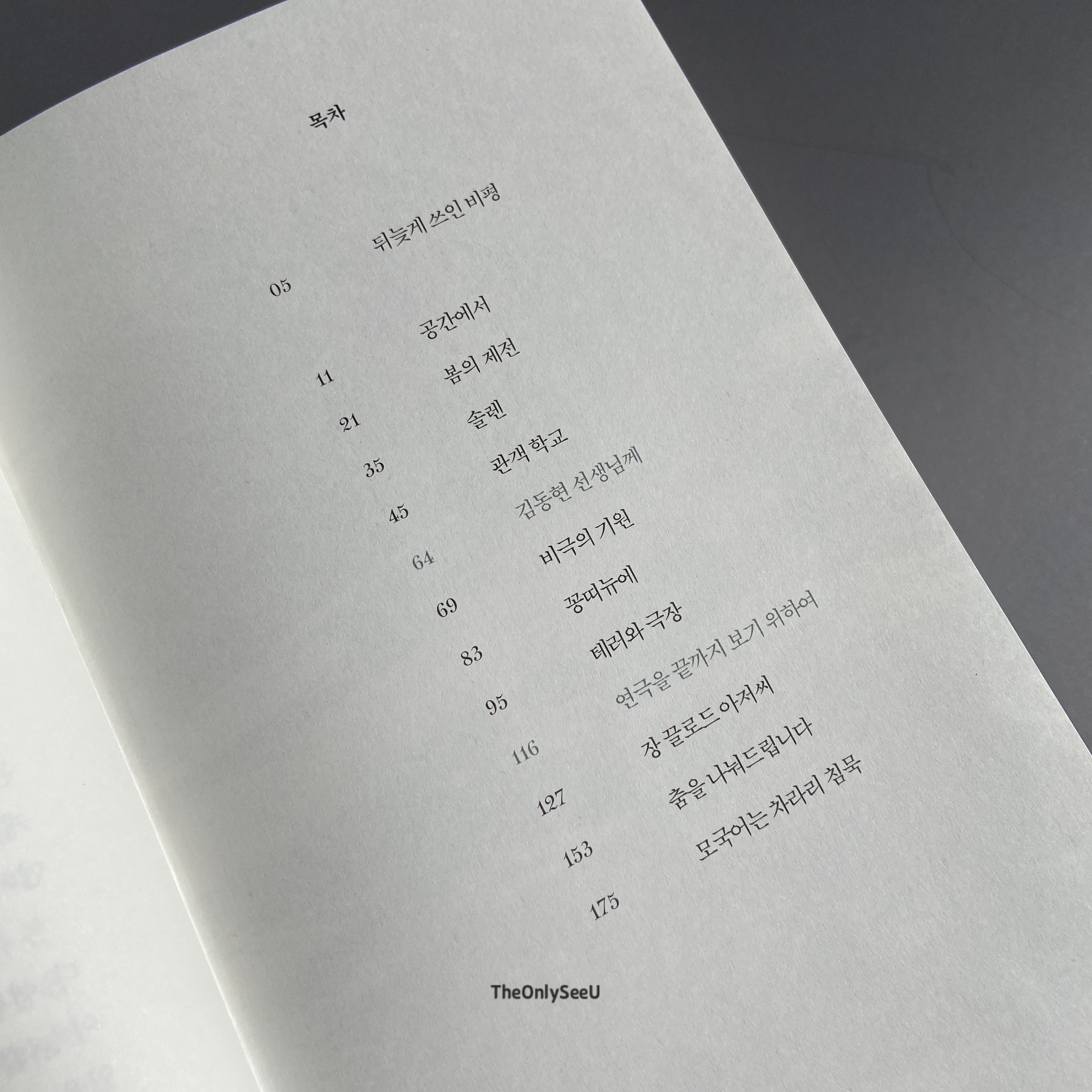
목차를 보면 12장의 그리 길지 않은 글들이 쪼개어져 마치 단편 소설을 모아둔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읽어보았을 때 가장 처음에 말했듯이 굉장히 독특한 문체를 마주하고 충격을 받았다. 아주 좋은 의미의 충격이었다. 한 문장이 짧게 끊길 때는 시 같다가도 길게 이어질 때는 짧은 소설 같기도 했기 때문인데 나는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럼에도 전부 읽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약 한 달 정도가 걸렸는데, 이는 읽은 날보다 읽지 않은 날이 더 많았던 까닭이다. 온전히 이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1장씩, 좋아하는 구절과 문장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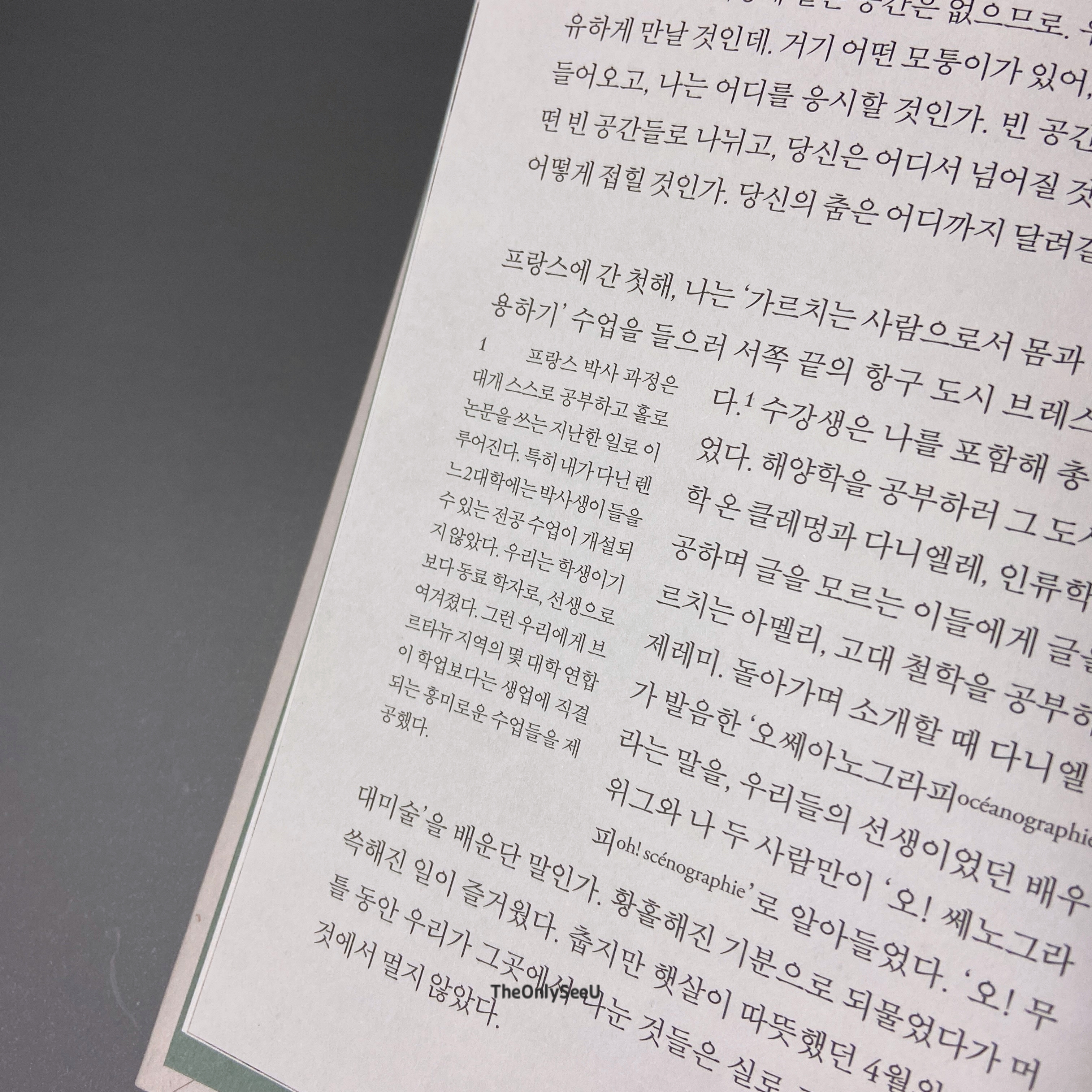
또 하나 신기했던 것은 각주가 아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본문을 밀어내면서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는 점. 시선 처리가 부드러워 아래에 있는 여느 책들보다 글이 더 잘 읽혔다.

이렇게 각 장마다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사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 추천하는 장과 기억에 남는 문장들
읽어봤으면, 하고 추천하는 장은 ' 솔렌 '. 책을 전부 읽고도 제일 먼저 기억나는 문장이 위치한 장이었다.
역시 모두들 웃으며 손을 내렸고, 한 이란 사람이 일어났다. 그는 객석을 향해 말했다. 이란에서는 춤추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그렇지 않은데, 당신들은 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보고 문득 내가 부끄러워졌다. 저자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자기혐오에 빠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크게 와닿았던 것 같다.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아주 많지만 그중 일부만 아래에 적어본다.
우리는 영영, 제전을 잃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봄을 잊지 못한 채.
하지만 그날은 미처 피로를 정돈할 시간이 없었고, 아름다운 것은 하필 그럴 때 불쑥 찾아오곤 하는 것이었으므로.
분명 위로받았다. 내 안의 가장 어둡고 탁한 곳을 감싸는, 대신 질러주는 무참한 문장들이 좋았다. 모든 가려진 것들에 대한 완강한 편애가 좋았다.
누군가 ' 믿는 체하려는 것 ' 은 결국 그가 ' 믿고 싶은 것 ' 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싶은가. 아마도 나로부터 먼 것. 멀어서 찬란한 것. 그것을 꿈꾸게 해주는 데 본디 예술의 임무가 놓여 있던 것은 아닌지. 애초에 그래서 인간은 허구를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닌지.
여전히 얼마간, 무용하므로 아름다운 채.
나는 아픈 쪽이 훨씬 좋았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그를 온 세상이 알도록 쩌렁쩌렁 사랑했다.

